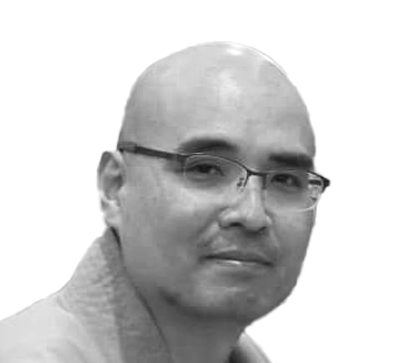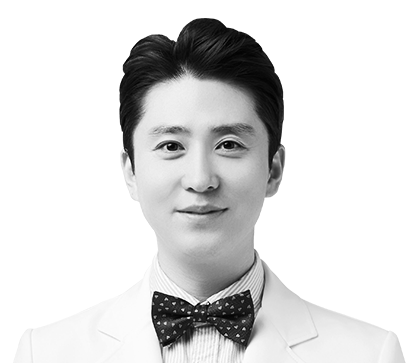休·味·樂(휴·미·락)
생명력 넘치는 봄의 미식, 주꾸미

주꾸미와 낙지처럼 형제지간으로 보이는 해산물이 또 있을까. 생김새는 물론 다리 개수까지 같다 보니 이 둘은 종종 함께 언급된다. 하지만 주꾸미는 낙지보다 다리가 더 짧고 몸집도 작다. 그래서 '꼬마낙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이 때문인지 사람들은 기왕이면 주꾸미보다는 낙지를 우선으로 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춘곤증이 솔솔 몰려오는 봄이 오면 판세는 달라진다.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켜 세우는 낙지라 해도 이 계절만큼은 주꾸미의 맛과 영양 효능을 당해낼 수 없다. '봄 주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이 봄철 주꾸미의 저력을 보여준다. '자산어보(玆山魚譜)'에는 주꾸미의 다양한 이름이 소개된다. 주꾸미의 꿈틀거리는 모습 때문인지 구부린다는 뜻의 '준(蹲)'자를 써서 '준어(蹲魚)'라 불렸다. 또한 대나무 순이 나올 때 가장 맛있다 하여 속명으로 '죽금어(竹今魚)'라 칭하기도 했다. 이후 '죽금어'가 '주께미'를 거쳐 '주꾸미'라는 이름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주꾸미는 봄이 되면 머리에 소복하게 알을 이고 있다. 머리같이 생긴 부위는 실제로는 몸통인데, 봄이 되면 산란기를 맞아 알이 꽉 찬다.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서는 주꾸미에 대해 "초봄에 잡아 삶으면 머릿속에 흰 살이 가득 차 있는데 살 알갱이들이 찐 밥과 매우 비슷하다"고 기록했다. 이 밥알 같은 모양 덕에 주꾸미 알을 '주꾸미쌀밥'이라 부르기도 한다. 잘 익은 알을 오독오독 씹으면 입 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과 함께 진득한 크림으로 변한다. 비린 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고급스러운 고소한 맛이 사르르 녹아내린다. 그야말로 봄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미식이다. 주꾸미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맛있을까. 1948년 손정규가 지은 '우리음식'에서는 주꾸미를 '어회(魚鱠)'로 먹었다고 적혀 있다. 생회나 숙회로 손질한 뒤에 주로 초고추장을 찍어 먹었다. 맛과 영양이 무르익은 주꾸미는 거창한 요리법보다는 그 신선한 맛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단순한 조리법이 최고다. 이 외에도 맑은 국에 넣어 주꾸미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는 요리를 즐겨 먹었다고 한다. 주꾸미는 피로 개선을 돕고 간 기능을 보호해 주는 타우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주꾸미의 타우린 함유량은 무려 낙지의 2배, 문어의 4배, 오징어의 5배나 된다. 주꾸미는 특히 돼지고기와 함께 요리하면 궁합이 좋다. 주꾸미의 타우린 성분이 돼지고기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주꾸미와 돼지고기를 활용하여 맛과 영양 모두 2배로 올려주는 '주꾸미 동그랑땡'을 소개한다. 살짝 데친 주꾸미는 식감이 씹힐 정도의 크기로 작게 다진다. 마늘, 고추, 양파 역시 잘게 다진다. 돼지고기는 잘게 다지거나 아예 다짐육으로 준비해도 좋다. 손질한 재료를 한 곳에 모두 넣고 접착제 역할을 하는 계란, 전분 가루를 풀어 섞는다. 이제 한 입 크기의 동그랑땡 모양을 빚어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서 잘 구워내면 완성이다. 재료가 다 익어갈수록 탱글탱글한 탄력이 생겨 앞뒤로 뒤집는 손길에 경쾌함이 묻어난다. 노릇노릇 잘 구운 주꾸미 동그랑땡을 한 입에 쏙 먹어보자. 봄의 생명력을 가득 담은 보양식으로 이만한 맛이 또 없다.